반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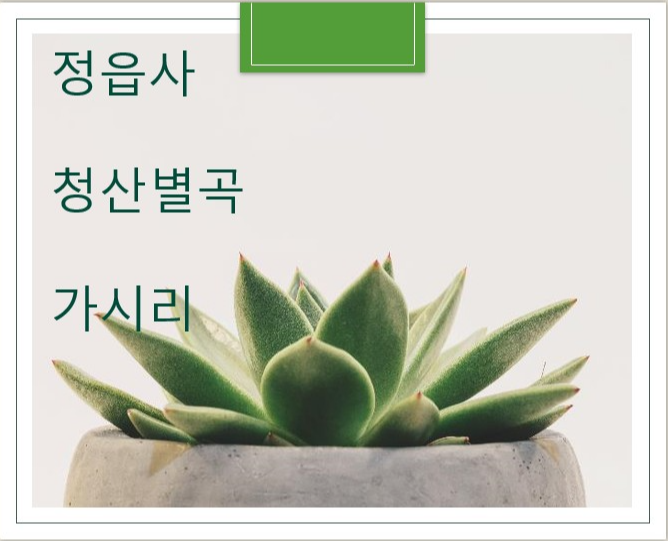
백제문학 <정읍사>, 고려시대의 <청산별곡>과 <가시리>는 소개하겠습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문학입니다. 고려의 <청산별곡과>과 <가시리>는 지은이를 모릅니다. 옛 시들로 맞춤법과 철자에 오류가 있습니다만 소개드리고 현대어로 해석 감상하겠습니다.
정읍사 (井邑詞)
-어느 행상인의 아내-
달하, 높이곰 돋으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진 데를 디디올세라
어기야 어량됴리
어느 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데 점그랄세라
어기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현대어 해석 및 감상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추어 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당신 가시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화자는 멀리 떠난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달에게 "높이곰 돋으샤/ 어기야 머리 곰 비취오시라" 빕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로 백제 멸망 이후에도 전라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천년동안 입에서 입으로 불리어 오다가 조선 성종 때 이르러 [악학궤범]에 기록되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노래 중 가장 오래된 노래로 교과서에 자주 출제되어 내신에서 꽤 중요한 작품입니다.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일어나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본다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저링공 하여 낮으란 지내와 손 저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현대어 해석 및 감상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서 살겠노라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겠노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내노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본다
이낀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본다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 왔으나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의 후렴구가 각연마다 붙어있군요.
청산별곡 가사 성격에 대해서 첫째, 청산에 들어가 머루나 다래를 따먹고 살아야 하는 민중의 괴로운 삶을 나타낸 민요.
둘째, 민란民亂에 참여한 민중들의 혼합집단 노래.
셋째, 슬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실연 失戀한 사람의 노래.
넷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을 찾아 위안을 구하며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노래.
다섯째, 닫힌 세계 속에서 사는 여인의 한과 고독의 노래등 여러 가지 의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산별곡은 전편이 [악장가사]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노래라는 확증은 없지만 조선초기의 가요와 전혀 다르고 고려의 <서경별곡>이나 <쌍화점>과 유사하여 고려시대 가요로 보고 있습니다.
작자에 대해 개인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민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 8연의 노래 중 한글표기법의 한계로 4연만 소개하였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난
위 증즐가 태평성대
날러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난
위 증즐가 태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마나 난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태평성대
설온 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난 닷 도셔오소서 나난
위 증즐가 태평성대
현대어 해석 및 감상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 서운 하면 다시는 아니 올까 두려워서
서러운 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나니
가지 마자 곧 돌아오십시오
3 음보의 고려가요로 이별을 노래한 작자미상의 작품입니다.
4연으로 구성되어 이별을 잘 표현한 노래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잘 엮여서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용향악보]에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